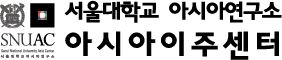국내 체류 이주민 25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로 생긴 빈 일자리들이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산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정부는 올해 16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결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내국인 근로자까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외국 인력의 고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고용허가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도,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날 자유도 ‘없다’ 살람 씨(가명)는 한 축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갈 무렵,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해고와 기숙사 퇴거를 통보했다. “내 사업장이니 내보내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야 했던 살람 씨. 그러나 모텔을 전전하는 상황보다 괴로웠던 것은 사업장을 옮기는 것마저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터에서만 일을 하도록 한다.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제약이 많다. 신청 기한부터 횟수, 지역 이동까지. 무수한 제한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발목을 옥죄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내내 이어져 온 고질적인 갈등이다.
■ “일할 사람 한 명이 절실한데…” 사실상의 ‘노예제도’라는 오명과 함께 사업주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만났다. 한 육가공 업체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착 하루 만에 퇴사를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할 사람 한 명 한 명이 절박해 무료 기숙사와 맞춤형 식단까지 제공했지만, “이 업종이 싫다”며 퇴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 해당 업체 대표는 요즘엔 오히려 사업주들이 ‘을’이라고 말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현실이 억울하다며,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 정부의 모순된 행보, 그러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제도에, 정부와 정치권 역시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이민청 설립 등 세태를 반영한 개선·보완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일선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주를 중재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이어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가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된 시대. 우리 정부는 이미 다가온 ‘대 이민의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공존의 조건-그 실마리를 찾아 경기도 포천의 한 한과업체를 취재했다. 고용허가제로 부족한 일손을 채워 온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받아 본 적이 없다는 업체. 기숙사부터 비자 전환까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일상을 살뜰히 챙기는 회사. 신민아·박보검·조인성 등 한국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달고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업체 대표의 말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 우리 사회와 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본다.
■ 프로그램 자문 및 출연 : 정현주 교수(아시아이주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MPNHL5FhtYs